슈뢰딩거의 1935년 논문은 양자역학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인 얽힘과 측정을 다룬다. 특히 처음으로 ‘양자 얽힘’의 개념을 정립하면서 상세하게 논의하고 있다. 이 논문에 대해 세 번에 걸쳐 소개한다.
“슈뢰딩거의 1935년 논문”
(1) 슈뢰딩거의 묘비명
(2) 얽힘
(3) 측정
2019년 10월 29일
김재영 (녹색아카데미)
오스트리아 티롤에는 에르빈 슈뢰딩거의 묘가 있다. 그 묘비명에는 1942년에 슈뢰딩거 자신이 쓴 존재론적인 글귀가 새겨져 있다.
“Denn das, was ist, ist nicht, weil wir es fühlen,
E. S. 1942
Und ist nicht nicht, weil wir es nicht mehr fühlen.
Weil es besteht, sind wir und sind so dauernd.
So ist denn alles Sein ein einzig Sein.
Und dass es weiter ist, wenn einer stirbt,
sagt dir, dass er nicht aufgehört zu sein.”
“그러니까 있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더 이상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지속되므로, 우리는 있으며 그렇게 이어진다.
따라서 그렇게 모든 존재는 하나뿐인 존재이다.
그리고 누군가가 죽는다 해도 그것이(그가) 계속 존재하며
그것이(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림 1] 슈뢰딩거의 묘비명. 오스트리아 티롤 (사진 : 김재영)
슈뢰딩거는 마흔 살이 되던 생일(1927년 8월 12일)에 자신의 묘비명을 미리 쓴 적이 있다.
Er hatte mit seinem vierzig Jahren
1927. 8. 12. E.S.
Von Leben weniger erfahren
Als manche von den Jüngern um ihn her.
Und dennoch wusste er erheblich mehr davon,
Wie dieses Weltgetrieb im Innersten zusammenblieb
Als er zu sagen sich erkühnte,
Obwohl er nicht den Namen “Prud” verdiente.
Sein Wissen stab zum Glück mit ihm,
Jetzt teilt er’s mit den Cherubim.
Ob denen Neues brachte sein Bericht,
Das wusste er zu Lebzeit selbst noch nicht.
그가 지낸 40년 동안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경험이 적었다.
그 주변의 다른 제자들에 비해.
그러나 그는 더 많은 것을 알았다.
이 세계가 그 안에서 어떻게 묶여 있는지.
그는 거기에 대해 아는 척 하지 않았다.
비록 그가 “샌님”이라 불리기는 어려웠지만.
이 지식이 그와 함께 사라진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이제 그는 이것을 케루빔과 나눌 수 있다.
이 소식이 새로운 것이 될지는
아직 살아 있는 동안에는 결코 알 수 없었다.
인도 고대철학 우파니샤드에 나올법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이 아리송한 묘비명들은 무슨 의미일까? 혹시 양자역학과 무슨 관련은 없을까? 에르빈 슈뢰딩거는 양자역학을 만들어내지 않았다. 적어도 1930년대의 노벨상 위원회는 그렇게 보았다. 하이젠베르크의 1932년 노벨물리학상 업적은 “양자역학을 만든 공로, 그리고 이를 응용하여 특히 수소의 동소체 형태를 발견하게 한 공로”이다.
이에 비해 1933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슈뢰딩거와 디랙의 공동업적은 “원자이론의 새로운 생산적 형태를 발견한 공로”이다. 또 1924년에 ‘양자역학’(Quantenmechanik)이란 이름을 처음 만들어 제안한 사람은 다름 아니라 막스 보른이다.
물론 그 이전부터 ‘양자가설’(quantum hypothesis)이란 말이 사용되기도 했고, 보어-조머펠트 이론을 ‘양자이론’(Quantentheorie)으로 지칭하기도 했지만, 이를 ‘역학’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사실상 새로운 이론체계로 제시한 것은 보른의 공이다.
그렇다면 슈뢰딩거는 양자역학에 어떤 공로를 세웠을까? 물론 슈뢰딩거의 방정식과 거기에 바탕을 둔 파동역학은 인류사에 길이 남을 거대한 업적이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는 ‘슈뢰딩거의 고양이’가 더 유명하다. 이 역설 같은 이야기가 세상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35년이었다.

아인슈타인-포돌스키-로젠 논변이 미국에서 발표되던 그 해에 세 번에 걸쳐 독일의 <자연과학지>에 발표된 슈뢰딩거의 논문 “양자역학의 현재 상황 (Die gegenwärtige Situation in der Quantenmechanik)”*은 흔히 거시적인 대상에는 양자역학을 적용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거나, 미시적 대상에서의 양자역학적 중첩이 증폭되어 거시적 대상에서 발현하는 상황을 말해 준다거나, 일종의 역설로서 양자역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 논문은 양자역학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처음으로 ‘양자 얽힘’의 개념을 정립하고 상세하게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분하게 음미해볼만한 가치가 있다.
슈뢰딩거의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 모형의 물리학
§2. 양자역학에서 모형변수의 통계
§3. 확률예측의 예
§4. 이론의 기초를 이상적인 앙상블에 둘 수 있는가?
§5. 변수들이 정말로 흐려지는가?
§6. 인식론적 관점의 의식적 교체
§7. 기댓값의 목록으로서의 ψ함수
§8. 측정의 이론 1부
§9. 상태의 서술로서의 ψ함수
§10. 측정의 이론 2부
§11. 얽힘의 풀림. 실험자의 의도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
§12. 예
§13. 예의 계속: 모든 가능한 측정은 명백하게 얽혀 있다
§14. 얽힘의 시간에 따른 변화. 시간의 특별한 역할에 대한 고찰
§15. 자연원리인가, 계산도구인가?
슈뢰딩거는 고전물리학에서 상태(Zustand) 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관찰을 통해 자연의 대상에 대한 표상을 만드는 것은 기하학에서 부분을 통해 전체를 구성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이렇게 대상에 대한 표상을 결정하는 부분(Bestimmungsstücke)이 바로 상태이다.
고전통계역학에서는 상태의 개념이 입자들의 위치와 운동량으로 표현되지만, 양자역학에서는 하이젠베르크 미결정성 관계(Ungenauigkeitsbeziehung) 때문에 이러한 상태 규정이 어려워진다. 즉 기브즈의 앙상블 개념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고전적인 상태 규정이 아니라고 해도 적절한 수학적 장치가 있어서 이로부터 임의의 시간에 모든 변수에 대해 통계적 분포를 결정할 수 있다면 상태 규정으로서의 역할은 다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양자역학에서 확률분포만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해서 대상이 이것 또는 저것으로 명확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흐려져서 어중간한 구름이나 안개처럼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슈뢰딩거의 주장이다. 미결정성 관계의 의미에 대한 해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5절에서 도입하는 고양이의 사고실험이다.
* Erwin Schrödinger. (1935) “Die gegenwärtige Situation in der Quantenmechanik.” Die Naturwissenschaften 23: 807-812, 823-828, 844-849; J.D. Trimmer transl. (1980). “The present situation in quantum mechanics: A translation of Schrödinger’s ‘Cat Paradox’ paper.”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124(5): 323-338; reprinted in J.A. Wheeler & W.H. Zurek (eds.) (1983). Quantum Theory and Measurement. Princeton University Press, 152-167.
(2)편에 계속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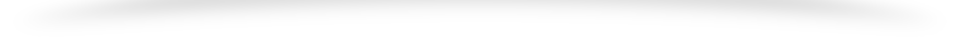
핑백: 녹색아카데미 뉴스레터 10월 (II) – 녹색아카데미 Green Academy
핑백: 녹색아카데미 뉴스레터 10월 (II) – 녹색아카데미 Green Academy